캐나다에 지낸 지 벌써 3년 차이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첫해는 워킹홀리데이로 와서 일보다는 놀고, 외국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영어 실력을 향상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그 수단에는 “배드민턴”이 이용됐고, 효과는 대단했다.
 |
||
배달이가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남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점. 이게 굉장히 주요했다. 본래 성격이란 게 어디 갈까, 한국에서도 모르는 사람에게 같은 그룹에서 운동한다는 이유로 말을 걸거나 새로운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 성격이 언어가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뀌었다고 바뀔 리 만무했다. 친한 사람에겐 더욱 가까워지는 걸 좋아하지만 나이 서른 넘기고 처음 와본 이 캐나다라는 나라의 사람들은 나에게 모두 새로운 사람이었다.
이때 “배드민턴”을 통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다.
독자분들 중에서도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캐나다 팀의 배드민턴은 그리 강하지 않다. 당연히 국민 중에도 배드민턴을 잘 치는 사람이 적다. 게다가 필자가 있는 이 빅토리아라는 섬은 그 인프라가 더욱 작아진다. 그렇게 한국에서 B조 수준인 배달이는 캐나다에 온 지 일주일 만에 많은 캐나다 배드민턴 커뮤니티에서 조금은 소문이 났었다.
“한국에서 구력 5년의 배드민턴을 좀 치는 학생(?)이 왔대.”
사실 학생도 아니고, 잘 치지는 않지만 이렇게 소문이 한번 나니 운동하러 가기가 굉장히 편해졌다. 말은 조금 안 통해도 내 이름을 이미 알고 나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 배달이도 배달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더 관심이 있거나 일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옆 나라에서 왔냐며 친근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신기하게도 캐나다 국민 중에 일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다. 음식, 문화 등.
어쨌든, 그렇게 더듬더듬 얘기하고 천천히 상대방의 말을 듣다 보니 그렇게 조금씩 영어가 트이기 시작했다. 필자에게 체육관은 그렇게 운동도 하면서 영어도 하는 공간이 됐다. 약간의 스포트라이트도 받으면서(?)
그 관심들이 나쁘진 않았다. 필자처럼 직접 다가가는 걸 쑥스러워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고 하는 게 괜찮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는 가볍게 맥주 한 잔도 하고 같이 캠핑도 다니고 하면서 더욱 친해졌다. 물론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영어도 조금씩 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특히 들을 때. 물론 눈치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래야만 이야기를 이어갈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국인으로서 캐나다에서 배드민턴 치는 학생(?)의 입지를 조금씩 다져갔다.
캐나다의 첫 직장도 배드민턴을 통해서
캐나다의 첫 직장도 배드민턴을 통해서
 |
||
어머니를 통해서 배드민턴을 배운 후 정말 잘 써먹는다. 캐나다에서 구한 첫 직장도 한인 배드민턴 클럽을 통해 만난 분의 가게에서 잡았다. 워킹홀리데이를 위해 저축해 간 돈이 그리 많지는 않아서 두 달 정도만 제대로 놀고 이후에는 바로 일해야 했다. 짧은 영어로 20곳이 넘는 로컬 매장에 이력서를 돌려봤지만, 연락이 오는 곳은 하나도 없었다. 지금 와서 보면 소통의 문제가 가장 컸다고 생각한다. 이력서 주고 이름 물어보고 ‘우리 매장에는 왜 지원하는 거야?’라고 했을 때 못 알아들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나왔으니.
그러다가 한인 클럽 회장님의 가게에서 주방 사람을 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주방?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인데 괜찮을까, 내가 요리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단 일주일. 통장 잔고가 떨어져 나가는 게 보이자 그 고민은 싹 사라졌다. 바로 지원했고, 바로 면접 보고 그다음 주부터 일했다. 그리고 3년을 일했고, 이곳에서 영주권까지 받았다. 우여곡절도 많은 곳이었지만, 내 인생에 절대 잊지 못할 경험이었고 값진 사회생활이었다. 그렇게 캐나다에서 또 배드민턴을 활용했다.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 대회 우승 이후
지난주 수요일 배드민턴 클럽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다.
필자는 배드민턴 대회 때 긴장을 풀고 팀의 흥을 올리기 위해 기합을 온 힘을 다해 지르는데, 이번 대학교 대회가 어찌나 떨렸는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 점, 한 점 목청껏 소리 질렀다. 덕분에 우리 팀 경기는 결승도 아니었는데 첫날부터 관중이 생겼다. 하지만 그 관중의 대부분은 우리 팀이 아니었다.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 팀 내에 낀 어웨이 한국 팀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는 배달이TV에서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살짝 서럽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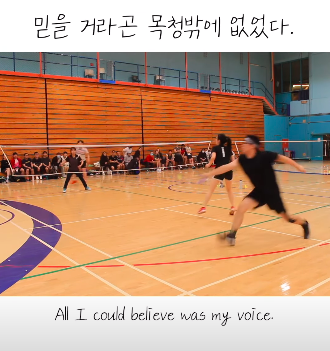 |
||
| ▲ 배달이TV에 올라와있는 쇼트영상 | ||
하지만 스포츠 경기가 그렇듯,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혼합복식 경기에서 우승했고, 수요일 클럽에서 알아보는 친구들이 생겼다. 그런데 재밌었던 게 이 친구들 파이팅이 엄청나다. 사실 필자는 클럽 내에서 경기할 때는 조용히 하는 편이다. 위에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날 대학교 대회 때 봤다고 하는 친구들. 자꾸 점수 내고 나를 보면서 기합을 지른다.
‘나한테도 해달라는 건가. 난 아직 부끄러워. 대회는 상대 팀을 다신 안 볼 것 같아서 그렇게 내지르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만 나 좀 바라봐. 그래 잘했다 잘했어.’
다음 주에 또 볼 것 같은데, 용기 내서 경기 끝내고 말을 좀 걸어봐야겠다. 이렇게 또 배드민턴 친구가 생겨버렸다.
 |
||
| ▲ 캘거리에서 열렸던 캐나다 오픈 | ||
앞으로 캐나다에서 국제대회가 열린다면
4월에 코리아오픈과 광주 마스터즈가 열리면서 국제대회를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게 실감 났다. 캐나다에서는 이제 마스크 착용도 선택 사항으로 바뀌면서 2022년에는 드디어 캐나다 오픈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장소가 캘거리라 필자 거주지에서부터 거리가 꽤 되지만 올해가 안 된다면, 내년에는 꼭 가보고 싶다.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사귄 배드민턴 친구들이랑 가도 좋겠다. 이미 두 명은 섭외해둔 상태이다.
4월에 코리아오픈과 광주 마스터즈가 열리면서 국제대회를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게 실감 났다. 캐나다에서는 이제 마스크 착용도 선택 사항으로 바뀌면서 2022년에는 드디어 캐나다 오픈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장소가 캘거리라 필자 거주지에서부터 거리가 꽤 되지만 올해가 안 된다면, 내년에는 꼭 가보고 싶다.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사귄 배드민턴 친구들이랑 가도 좋겠다. 이미 두 명은 섭외해둔 상태이다.
이 섬 안에는 배드민턴 대회가 많이 열리지는 않지만 페리 타고 밴쿠버만 나가도 엘리트 선수 경기부터 BC주 순위를 가리는 큰 경기 등을 볼 수 있다. 그동안은 한국 다녀온 후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느라 이런 걸 알아볼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젠 여자 친구도 배드민턴을 같이 치게 되면서 좀 더 같이 갈 수 있는 명분이 단단해졌다.
점점 기대된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제대로 된 캐나다 라이프를 즐길 생각에 설렌다.
 |
||
박병현 객원기자 hooney0313@naver.com
<저작권자 © 배드민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